10살 아들의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2004년 11월,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델뤼크는 “신경세포 종류”란 확진을 받았다. 신경세포 종류는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항암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끔찍한 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리크는 포기하지 않고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및 골수천자 등 많은 치료를 받고 스스로 열심히 병과 싸워냈지만 끝내 그는 부모님 곁을 떠나야만 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웃음을 보여준 아이의 나이는 고작 10살. 아직도 왜 그에게 이렇게 잔인한 병이 찾아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델리크의 단 친혈육인 어머니 신디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포기했고 5살 되는 딸애는 친구 집에 맡기며 아들의 투병생활에 집중했다.
어머니는 항상 웃기 위해 노력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경세포 종류는 어린 나이의 델리크가 감당하기에는 끔찍하고 힘들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질수록 그의 고통은 심해졌고 항상 웃던 델리크가 화를 내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그를 눕혀놓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 때마다 “어머니. 나는 왜 이런 아픔을 참아야 하는 거죠?”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어머니 신디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델리크 어머니에게 “암세포가 이미 척추와 기타 장기들에 침범했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신경세포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조혈세포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수준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델리크만큼 의료진도 최선을 다했다. 매번 델리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뜯어내는 수술을 했고, 고통 속에서도 델리크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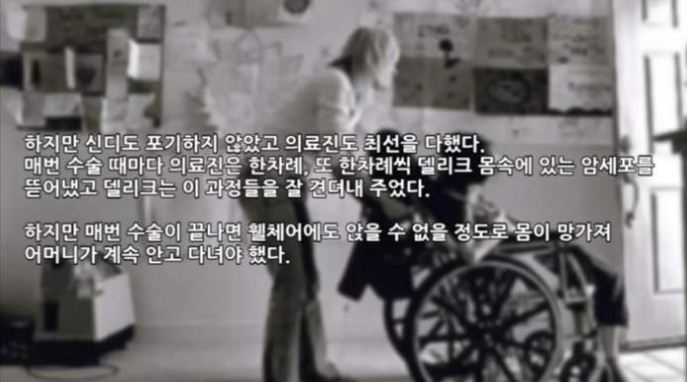
매번 수술이 끝나면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말이다.
델리크는 의료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괴롭혀?”라고 욕하기도 하고 “엄마가 시킨 거지? 난 엄마가 미워. 나를 이뻐하지 않잖아! 엄마를 신고할 거야” 등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순수했던 델리크는 어머니와 의료진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상상 그 이상이었다.
어느 날 의사는 신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렸다. “더이상 방법이 없다. 신경세포를 이식하더라도 델리크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델리크의 일생을 마치도록 도와주자.”라고 제안했다.
델리크의 병세는 점점 악화돼 눈언저리까지 검은색을 띄게 만들었다. 델리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신디는 아들을 먼저 보낼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을 일들을 함께했다. 델리크가 가장 즐기던 증기욕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아들의 정서에 화기를 돋구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 큰 암 덩어리로 고생하는 델리크였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온종일 즐거운 모습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델리크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미 실명된 델리크는 눈을 뜨고 어머니에게 “사랑해요 어머니. 저를 죽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신디는 떨리는 손으로 결국 안락사 협의서에 서명을 했고, 의사가 놓은 주사액이 델리크의 체내로 조금씩 흘러들어 갔다.
7시간이 지난 후 델리크는 어머니 신디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신디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영원히 엄마 마음속에 있단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